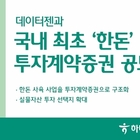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한국 증시에서 ‘중복 상장’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LG그룹과 LS그룹이다. 두 그룹은 유독 자회사 쪼개기 상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이들이 채택한 지배구조 모델과 사업 확장 방식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한국 증시에서 ‘중복 상장’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LG그룹과 LS그룹이다. 두 그룹은 유독 자회사 쪼개기 상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이들이 채택한 지배구조 모델과 사업 확장 방식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핵심은 ‘한국형 지주회사 시스템’이다. LG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대표적 사례다. 지주회사 아래 여러 사업 자회사를 두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 나타나면 이를 물적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상장시키는 방식이 반복됐다. 표면적으로는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모회사에 투자했는데, 가장 성장성이 높은 핵심 사업이 분리돼 상장되면서 ‘알짜 자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껍데기와 불확실성, 그리고 주가 디스카운트다.
LS그룹의 경우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유사하다. LS는 LG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 ‘자율 경영’과 ‘독립 채산제’를 앞세운 구조를 유지해왔다. 각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일정 단계가 되면 자회사를 상장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문제는 이미 모회사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상장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상장사 안의 상장사’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자금과 성장 스토리는 자회사로 쏠리고 모회사는 점점 존재 이유가 흐려진다.
두 그룹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모두 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이론적으로는 모회사가 내부 유보금을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전략 속에서 투자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쉬운 선택, 즉 ‘핵심 사업부를 떼어 IPO로 시장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결국 경영 전략의 문제라기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두 그룹은 공통적으로 주주를 ‘동반자’라기보다 ‘자금 조달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업이 커질수록 내부 자본으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기보다,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확보하는 쪽을 택한다. 단기적으로는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신사업 확장 속도도 빨라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희생되는 시스템이 된다.
중복 상장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지주회사나 대기업 모회사에 투자할 때, “언젠가 또 핵심 사업을 떼어내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기대다. 과거의 행태가 미래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LG와 LS의 중복 상장 논란은 한국형 지주회사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이자, 대기업 경영진이 선택해 온 ‘손쉬운 성장 전략’이다. 문제는 이 전략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손해는 기존 주주가 보고, 이익은 신규 투자자와 경영진이 가져간다.
중복 상장은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이 반복될수록 한국 증시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핵심 자산을 빼앗긴다’는 학습 효과를 강화하게 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LG와 LS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 전반은 영원히 ‘지주사 할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하나다.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인가, 주주 희생을 전제로 한 확장인가. 지금까지의 답은 너무 오래, 후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