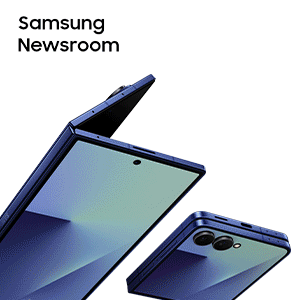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메신저 광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민병덕·김현 국회의원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메신저 광고 확장, 소비자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카카오가 도입한 ‘브랜드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카카오톡 회원 데이터와 매칭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사전 명시적 동의 절차 부재 ▲데이터 요금 부담 전가 ▲수신 거부 및 통제권 미비 등 다수의 쟁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브랜드메시지는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확대된 광고 전송 모델로 작동한다”며 “국민 플랫폼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별도의 재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 엄명숙 대표는 “광고 메시지가 국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자율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필 젬텍 대표 역시 “대형 플랫폼의 광고 확장은 중소사업자의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짚었다.
첫째, 사전 동의 부재 문제다. 브랜드메시지가 기존 가입 시 수집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외부 기업 광고를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데이터 요금 전가 문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5%가 광고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 차감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뜰폰·해외 로밍 이용자는 과도한 요금 부담을 떠안게 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셋째, 수신 통제권 미비다. 알림톡과 브랜드메시지의 구분이 모호하고, 개별 기업 단위 차단만 가능해 이용자가 일괄 수신 거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유사 서비스 확장 시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